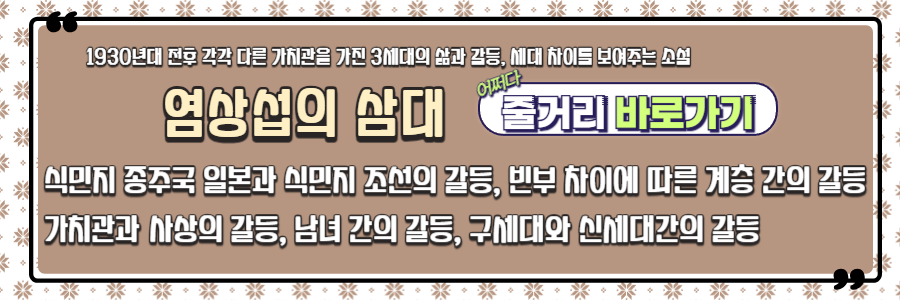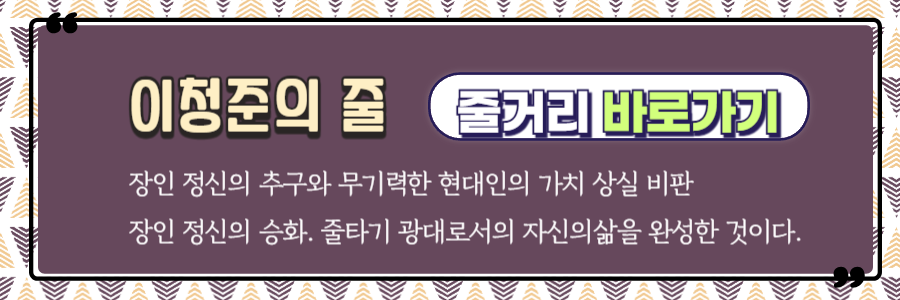1980년대 서울 중산층 가족의 삶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흐르는 북은 북을 치는 가치관에 대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흐르는 세대 간의 대립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 노인은 북을 치며 젊은 시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유롭게 예술의 혼을 불태우며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때문에 아들 민대찬은 불행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였다. 손자 성규는 예술을 쫓는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삶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전통세대(할아버지)와 기성세대(아버지) 간의 갈등을 새로운 세대(손자)의 가치관으로 이해하고 화합하시켜려는 의도가 보인다. 아버지 민대찬은 불우한 유년시절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여 출세지향적이며 현실적인 지위와 체면을 중요하는 기성세대 대표 인물이다. 이에 대립하며 손자 성규는 출세지형적과는 거리가 먼 데모(시위운동)를 하며 변혁적인 삶을 보여준다.
전통세대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며 기성세대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는 삶을 말한다. 손자 성규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해 변화를 요구하는 삶을 꿈꾼다. 세대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은 결국 화해하게 된다.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려는 출세지향적 삶을 깨고 변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작가는 현실과 이상, 안정과 변화의 갈등을 세대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세대 간 갈등과 극복 흐르는 북 줄거리
민노인은 평생 북을 치며 방랑하였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아들 민대찬은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어머니와 생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자수성가한 민대찬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체면과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다. 민노인은 아들 민대찬 내외 집에 얹혀 산다. 민대찬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둘 사이의 갈등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민대찬의 집에 고향 친구들이 놀러 와서 민노인에게 북소리를 청한다. 민대찬은 민노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이 깎였다며 다시는 북채를 잡지 말라고 다그친다. 그 후로 민노인은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면 밖으로 자리를 피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도 손자 성규만은 민노인의 예술적 기질과 삶을 이해한다. 예술에 열중하다 보면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이해한다.
성규는 민노인에게 대학 봉산 탈춤 공연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 한다. 민 노인은 고민 끝에 허락하고 탈춤 공연에서 북을 치면서 감동과 신명을 느낀다. 민대찬과 며느리 송여사는 민노인의 북 공연을 질책한다. 송여사는 민노인이 북을 쳤다는 것에 비난의 질문을 퍼붓는다. 나이 든 할아버지가 손자와 어울리며 북 치고 노는 것이 어른다운 행동이냐고 공격한다.
성규가 집에 들어오자 송여사가 야단친다. 성규는 할아버지를 동원한 일이 없으며 할아버지 스스로 북에 대한 열정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반박한다.
누군가(민노인)는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북 다르는 예술성)을 갖고 있을 때, 한쪽(성규)은 그걸 표현할 기회(예술적 재능 표현)를 주어야 마땅하며, 한쪽(민노인)은 기꺼이 그 기회에 편승해서 일이 잘되면 좋은 일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아버지가 유년시절을 불행하게 지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이해하지만 그 논리를 자신과 할아버지의 관계에 적용하지 말라고 설명한다.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기분 좋은 일이며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되고 화합한다면 기쁜 일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위협적인 자수성가이자 가장이기에 성규를 이해하지 않고 싸대기를 날린다. 그래도 성규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말한다. 성규는 이기적인 현실에 집착하며 현실적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아버지도 이해하며, 할아버지의 자유로운 예술적인 정신 구현도 이해한다고 받아친다. 성규와 아버지는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다.
일주일이 지났다. 송여사는 성규가 데모(80년대 학생 시위운동, 집회, 행진)하다가 경찰에 잡혔다는 전화를 받는다. 아들 내외는 밤늦도록 연락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속상한 마음에 아들이 남긴 양주를 마시며 북을 친다. 수경(손녀)은 할아버지의 북소리를 들으며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질문한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성규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나 구속에서 벗어나 변화를 꿈꾸며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영혼이라며 북을 친다.